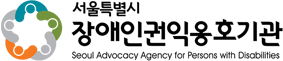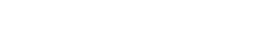장애인단체는 케이블카 찬성, 환경단체는 반대…“공익변호사끼리도 이견…소통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4:23 조회2,951회본문
장애인단체는 케이블카 찬성, 환경단체는 반대…“공익변호사끼리도 이견…소통 절실”
등록 : 2014.11.17 21:39수정 : 2014.11.18 17:16
한국 사회에 ‘공익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14일 오후 경기도 양주의 한 펜션으로 공익변호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1박2일 모임에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7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익변론 10년의 성과와 고민, 전망을 싸들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2004년 변호사 4명을 시작으로 공익 전담 변호사단체의 씨앗을 뿌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대형 로펌 공익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대변하는 ‘반올림’ 등 시민단체 변호사 등 소속은 다양했지만, 고민의 지점들은 비슷비슷했다. 행사를 공동기획한 공익변호사들은 “전업 공익변호사 수는 50명을 넘지만 이들 대다수의 연차가 낮고 경험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키울 네트워크가 절실하다”고 했다.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온 공익변호는 복잡한 숙제들을 안고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내부 소통’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가령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장애인들은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단체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같은 영역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다양한데, (공익변호 사이에) 공동연대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러 공익’을 어떤 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공익변론도 다른 소송들처럼 당사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대변하려는 단체와의 신뢰 형성은 공익이라는 이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 공익변호사 1세대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간사로 활동했다. 그는 “세월호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의 경우 공익변호사가 어떤 집단을 대변할 때 갈등 사안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논문까지 나온다.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과 인력 부족, ‘이곳에 뼈를 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만드는 불투명한 미래는 10년째 변함없는 공익변호사들의 1순위 고민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10개월간 접수된 사건만 550건이다. 이 가운데 30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는 그가 유일하다. “혼자서 이 일을 다 맡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다”고 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 비영리라는 고정적 틀을 깰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모금과 지원을 통해 공익변호사의 기본적 생존 조건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들은 어떨까. 이들은 ‘공익변호가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를 가진다’고 토로한다. 한 대형 로펌 소속 공익전담변호사는 “실천이 약하다. (소속 로펌에) 공익변호를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하지를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에게 소송은 당연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튿날까지 이어진 토론은 ‘소송으로 투쟁’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소송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초청받은 박래군 ‘인권센터 사람’ 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변론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결 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례 2014.11.18 17:16 양주/글·사진 서영지 이재욱 기자( yj@hani.co.kr) 기사 요약